정치인의 “독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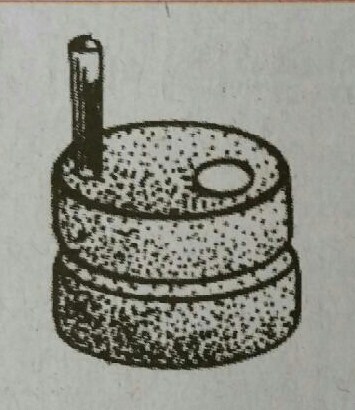
벚꽃잎이 흩날리던 자리에 라일락도 제법 향기를 품어내고 목단도 기운차게 대지를 곧 뚫고 나올 기세다. 때가 되어 알아서 올라오는 생명들에 감탄한다.
우리들도 꽃들처럼, 나무처럼 매년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 것일까? 어찌 보면 우리는 타조 같다.
자기를 만나기 두려워 혹은 진실을 직면하기 두려워 어두운 구명에 머리만 쳐 받고 큰 몸둥이는 하늘에 대고 있는 진실은 맥박이 쿵쾅쿵쾅 뛔고 피가 기운차게 돌고 대지에 발을 딛고 있는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직면을 피하기 위해 관념의 세계에 의지하는 면에서 타조와 닮아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 버릇이 되어 그것이 더 자연스러워서 습관 흘릭이 되었다는 걸 자각 못하고 그게 되풀이하다 죽으면 어쩌나? 사람마다 기본적인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이 반복된다.
늘 다른 상황인데도 그 패턴으로 해석되고, 하던 식으로 대응된다. 그러하니 삶은 지루하고 똑같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매순간 다르다는 진실을 알기는 하지만 패턴으로 일괄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현재는 놓쳐지고 과거가 펼쳐진다. 반복되는 꿈! 계속 다른 대상과 목적을 잡아보고 드라마틱한 재미를 추구해 보지만 헛헛함을 피할 수 없다. 왜? 패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꿈은 꿈일 뿐이다. 그 꿈속의 일이라는 걸, 일별하는 일, 이 세상은 이렇게 생겨나는 구나. 삶은 이렇게 업력의 발전소가 돌아가는 거구나.
나는 현재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구나---. 자각하는 것만이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을 보는 것이다.
송두리째 빼앗겼던 마음을 보는 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보는 일이다. 욕구는 마음을 죄다 빼앗겼었다는 걸 일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쓸 마음이 없었다는 걸 가슴 치며 후회하는 것이다.
그는 위선과 허풍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1842년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링컨이 정적(政敵)쉴즈를 조롱하는 글을 신문에 익명으로 냈다.
쉴즈는 기고자가 링컨이라는 걸 알아내고 결투를 겨루기로 했다. 결투 날 직전 입회인 중재로 가까스로 피비린내를 피한 링컨은 그날로 험담을 끊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인용한 성경 구절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였다. 영국 첫 여성 의원 에스터가 처칠 총리에게 “내가 당신 아내라면 커피에 독약을 타겠다”고 했다. 처칠은 잠시 생각하더니 “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그 커피를 즉시 마셔버리겠다”고 했다. 에스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칠은 상대방 독설을 유머로 무색하게 만드는 재주가 능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앞 다퉈 패일린과 사건이 무관치 않다. 지금까지 유권자에게 증오를 부추겨 온 보수 정치인과 논객들은 각성하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범인은 정신이상자일 뿐,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때 공화당이 칼을 든다면 우리는 총을 들 것이라고 한 것도 문제 아니냐고 맞서고 있다. 독설을 자제하자 그러면 시끄러움도 자제될 것이다. 독설을 양산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 정치인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함부로 뱉어내는 말은 스스로를 격하시키고 국민정신건강을 해칠 뿐이다.
독설을 주고받는 정치인들은 링컨의 반성과 처칠의 유머를 한 번 쯤 떠올렸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