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 놓고 기억자 낫이 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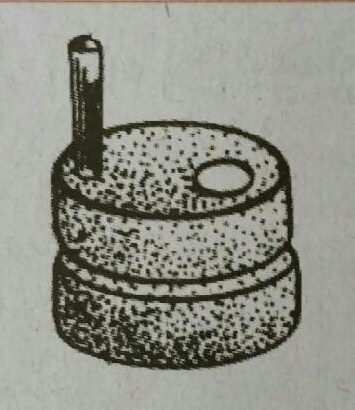
황 일 용 편집인
깜냥도 안 되는 쭉정이 비전과 철학은 오간데 없고 수신은커녕 제가도 못하면서 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마냥 쑥스럽다.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덩달아 뛴다는 이야기를 집어치고 며칠 후 문득 궁금했다.
“너 이번 말고 실제 낫을 본적 있냐?” “네, 지난번에 벌초 따라 갔을 때요.” 아들 녀석이 이야기한 “지난번”은 고등학생시절 즉 7∼8년 전 일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녀석이 20년 동안 실제로 낫을 본 게 한 두 번 밖에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실로 “낫 놓고 기억 자 모른다.”는 속담은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 “기억 자놓고 낫”을 모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돌이켜보니 그 밖에도 사망(?) 직전의 속담은 여럿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 간다”---. 요즘 청소년들도 이들 속담의 뜻은 대충 안다.
등잔, 홍두깨, 부뚜막을 직접 보고 사용하지 않았지만 국어책에서 배웠다.
그러다보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 뜻을 여럿이 뜻을 모으면 못할게 없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변해온 한국사회를 가르쳐 한 독일 철학자는 90년대 중반 “농촌에서 자란 기성세대와 계란과 통닭을 먹으면서도 실제 닭을 본 적이 없는 도시 세대가 공존하는 나라”라고 표현한바 있다.
물질적 변화와 더불어 정신적 변화, 세대차는 더욱 극심해졌다.
특히 지난 세가를 거치며 우리 사회의 세대차는 실질적으로 혁명적 변화를 겪었다. 근대세대가 아랫세대보다 지식이 많고 지혜로었다. 언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 주고 수학해야 하는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손자에게 가르쳐 줬다.
상처가 나고, 급체했을때 어떤 응급처방을 해야 하는지 어른 들은 다 알고 있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어른에게 여쭙고 말씀을 들으면 됐다. 여컨대 지식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 사회로 이동하면서 이 지식의 흐름이 역류(逆流)하기 시작했다. 근대적 고등교육 받은 자식이 농사일을 아버지보다 지혜롭지 못할지 몰라도 “아는 것”은 많아졌다.
디지털혁명 이후로는 현기증이 날 지경 “낫도, 기억자”도 모르는 꼬마들이 처음 보는 스미트폰을 가지고 능숙하게 “논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에이,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다. 이런 차이는 디지텔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는 차별로 때로는 대선 과정에서 본 것처럼 세대 간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답은 가족, 이해, 그리고 사랑에 있다는 것을 벌초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아들에게 낫질하는 법을 알려주는 이론을 서둘지만 땀흘리며 풀을 베고 나르는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한 사람이 성인으로 홀로서기까지 필요한 교육을 학교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 교육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담당하는지 의문이다.
나이 들면서 “학교에서 배웠으면 좋았겠다.” 나는 아쉬움을 느끼는 공부가 많다. 가령 싸웠을 때 화해하는 법, 아이 키우는 방법, 연애하는 법,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사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 등이다. 살면서 우리가 늘 마주하지만 어려워하는 것들이다. 심각함수나, 미분법 등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쓸 일이 없다.
하지만 다툼은 늘 생기고 사랑도 하고 아이도 길러야 한다. 수업을 통해 아이들을 부모의 책임감, 무분별한 성생활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한 경각심, 생명의 소중함, 피임의 중요성 등을 배웠다고 한다. 우리는 더욱이 “낫 놓고 기억자, 낫이 뭔데요”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