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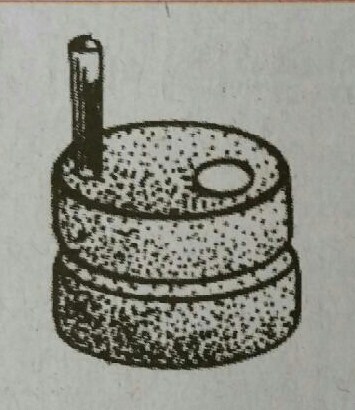
말은 마음의 나들이다. 남 앞에서 내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문자 그대로 ‘바깥나들이’, 외출한다는 것이다.
몸만 나들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나들이 한다. 그래서 몸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장을 한다. 사람들은 바깥출입을 할 때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 되도록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혹은 입던 옷도 매무새를 고친다.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엔 빗질도 한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자고 누구나 다소간은 멋을 부리는 것이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바깥나들이를 하는 것이라 되도록 말을 골라서 기왕이면 남의 귀에 듣기 좋도록 알아듣기 쉽도록 바른 말, 고운 말, 재미있는 말, 지루하지 않은 말을 하려 한다. 몸이 멋을 부리듯 마음도 꾸밈새에 말의 수사(修士)에 신경을 쓴다.
물론 몸과 말이 멋이나 꾸밈새는 매우 주관적인 것이어서 사람 따라 또는 시대나 지역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기름통에서 뽑은 것처럼 머리를 치장하고 손을 밸 것처럼 주름이 선 새 옷을 차려입은 잘 꾸몄다고 볼 수도 있다. TV에서 보는 우리나라 전현직 대통령들의 모습처럼… 그런 멋, 그런 꾸밈새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그런가 하면 해가 뜬 날에도 우산을 들고 ‘시티’(런던 중심가)를 쏘다니는 정장(正裝)의 은행원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영국의 귀족들은 캐주얼을 아무렇게나 입고 옷을 맞춰도 줄이 선 옷이 창피해서 아랫사람에게 한참을 입히고 난 다음 입는다는 얘기를 읽은 기억이 난다. 진짜의 멋, 고도의 꾸밈새란 꾸미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데 있다 할 것인가. 말도 너무 꾸미고 격식을 갖추면 오히려 촌티가 난다.
평상시에도 정장을 하고 기름통에서 뽑아 올린 머리처럼 치장한 말투보다 오히려 꾸밈없는 수수한 말이 더 미쁘고 사람 마음을 끄는 수가 있다.
생각의 외출이란 면에서도 글도 말에 못지않게 나들이 차림이 쉽지 않다. 글을 써 본 사람이라면 안다. 그래서 자칫 어깨에 힘이 들어간 초보자일수록 간단한 글도 서론, 본론, 결론의 격식을 차리다 촌스러운 글을 쓰기가 일쑤다. 그 바닥 고수들은 캐주얼의 멋쟁이처럼 서론, 본론 따위 아랑곳없이 대뜸 긴요한 얘기의 핵심을 찔러 보여준다. 현관, 대기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안방에 들어가 주인을 만나는 것처럼.
물론 몸과 말을 어떻게 꾸미든 최소한의 공통된 규범은 있다. 벌거벗은 알몸으로 나들이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육체의 나신이건 정신의 나신이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바깥나들이를 않는 것이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의 예의다. 아무리 욕심나도, 아무리 미워도 벌거벗은 욕망이나 벌거벗은 감정을 그대로 쏟아 내놓지 않는 것이 문명사회이다.
사사로운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다. 지도층에 있는 공인의 경우 이러한 말의 규범은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다.
국가와 국가를 상대하는 외교 세계에는 ‘외교사령’이란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농단에도 “여성의 ‘메이비(maybe)’는 ‘예스(yes)’요. 외교관의 ‘메이비’는 ‘노(no)’를 의미한다”는 말이 있다. 외교관은 함부로 속내를 내색하지 않는 다는 얘기다.
너그럽게 생각하면 요즈음 우리나라 정계의 민망하기 그지없는 여러 행태도 이해가 됨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