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맛과 살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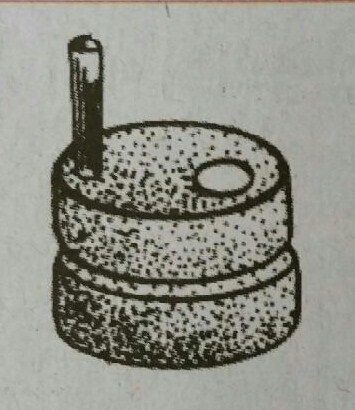
혼자 사는 노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밥맛이 없어, 입안이 까끌 해서 밥을 먹기 싫어,” 그래도 살기 위해선 물에 말아서라도 억지로 먹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가 자식들이 찾아와 삼겹살이나 생선을 구우면 사라진 입맛은 고스란히 살아난다. 손주들과 어울려 아이스크림이든 과자든 모든 군것질이 맛있고 재미있다.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 밥맛이 없다.
어찌 보면 밥맛은 살맛이다. 밥맛이 없다는 건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거기에 몸이 아프거나 누구와 다툼이 생기거나 생활에 곤란이 생기면 죽을 맛이 된다. 그렇다고 밥이 바뀐 것은 아니다. 밥이 상했거나 모래알이 섞인 것도 아닌데, 상황에 따라 그 맛이 바뀐다. 밥을 대하는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와 먹느냐 또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맛이 바뀐다.
우리 감각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눈, 귀, 코, 혀, 피부 등 그 감각기관에 의해 형체를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닿으며 느낌을 받는다.
눈으로는 보기 좋은 것과 못 볼 꼴을 본다. 귀로는 소음이나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며, 코는 더러운 냄새 또는 향기를 맡으며, 피부로는 거칠다 또는 부드럽다는 촉감을 느끼며, 혀 역시 달다 쓰다 맵다 등 감각에 민감하다. 모두 감각으로 직결되는 표현을 쓰는데, 혀는 좀 다르게 추상적이며 극단적이다. 유독 맛에 이르러 살맛이며 죽을 맛이며 하는 먹고 사는 문제, 즉 목숨과 연결된다.
당연히 밥맛이 없으면 일할 맛도 사라진다. 혹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해도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밥맛이며 살맛도 나지 않는다. 또는 똑같은 일을 해도 차별이 있으면 박탈감에 시달린다.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직장생활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죽을 맛이다. 퇴근 후 술을 마셔도 술맛이 쓰다. 그게 심하면 목숨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반면 여럿이 모여서 일을 하고 그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 화합이 잘 되면 일은 고역이 아니라 놀이가 된다.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면서 소풍 나오듯 밥을 나누어 먹고 재미가 있으면 놀이가 되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고통이다. 입맛이 쓰다.
필자는 누구든지 ‘저 사람 밥맛이야’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밥맛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됨됨이가 눈에 거슬리고 밉살맞아 상대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적혀 있다. 그래서 밥맛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사람 중에는 밥맛이 나게 하는 사람과 밥맛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밥이어도 그 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밥맛과 살맛과 죽을 맛으로 갈린다. 그 지도자가 머슴이 되어 열심히 일해서 주인인 국민을 떠받들겠다고 했으니 진짜 그렇게 되면 그는 밥맛이 아니라 진국이 될 것이다.
몇몇 특권층이 아니라 머슴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과 그 머슴을 선택한 사람들이 밥맛이 나고 일할 맛에 씩씩하고 명랑하며, 살맛에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주민들에게 선택된 지도자들에게 기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