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相生)과 조화(調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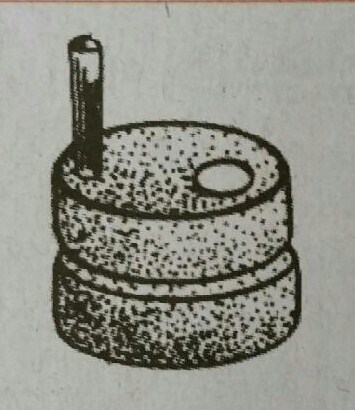
김영랑이 광복 직후 발표한 ‘북’이라는 시가 있다. 시집 〈영랑시선〉(1949)에 수록된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이 시의 텍스트를 보면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잡지’라는 구절을 서두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치지’라는 구절이 시의 말미에 등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북과 소리는 판소리의 연희를 구성하는 북장단과 소리를 의미한다. 판소리의 장단은 박자가 가장 느린 진양조부터 중머리, 중중머리를 거쳐, 박자가 서로 엇물리면서 변화하는 엇머리, 그리고 빠른 박자로 진행되는 자진머리, 휘모리 등으로 이어진다. 변화있는 북장단에 맞춰 소리를 할 때 혼연일체의 감흥이 살아난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수미쌍관의 수사방법을 활용하여 북장단과 소리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판소리는 고수(鼓手)가 북을 치면서 박자를 메기고 명창(名唱)은 사설을 풀어 노래하면서 서로 어울려 한마당의 소리판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전통 연회다. 소리판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데에는 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고수이명창(一鼓手二名唱)’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났다. 고수가 먼저이고 그 뒤를 명창이 따른다는 뜻으로도 풀이한다. 하지만 판소리에서 고수와 명창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다는 구분은 가당치 않다. 소리판에서는 고수와 창자 사이의 완벽한 조화가 필수적이다. 고수가 소리판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판소리의 흥을 살릴 수가 없고, 명창이 고수의 장단에 호응하여 따르지 못하면 판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다.
판소리에서 소리판의 흥취를 살려내는 데에는 청중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일고수이명창(一鼓手二名唱)’이라는 말 대신에 ‘일청중이고수삼명창(一聽衆二鼓手三名唱)’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소리판에는 마땅히 소리를 즐기는 청중이 모여야 한다. 소리판은 언제나 청중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그 무대가 열려 있다. 그러므로 청중의 호응이 없으면 소리판의 흥이 살아날 수가 없다. 청중이 ‘얼쑤’ ‘좋다’ 등으로 호응해 주어야 장단도 자유로워지고 명창의 소리도 호흡이 고르게 된다. 명창의 소리와 고수의 북장단에 청중의 흥취가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판소리의 높은 예술성에 도달하게 된다.
김영랑이 노래하는 ‘북’은 북장단과 박자에 소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청중도 저절로 신명이 나는 소리판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북과 소리의 조화에 청중의 호응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판소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조화와 균형과 호응이 따라야만 한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여럿이 서로 어울려 도우면서 살기 마련이다. 불과 물이 상극이면서도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삶의 과정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 호흡을 맞춰 살아가기란 쉽지 않지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모두가 한데 어울려야만 평화롭고 풍요한 삶이 가능해진다. 조화와 상생이야말로 참된 삶의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