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여유 있게 마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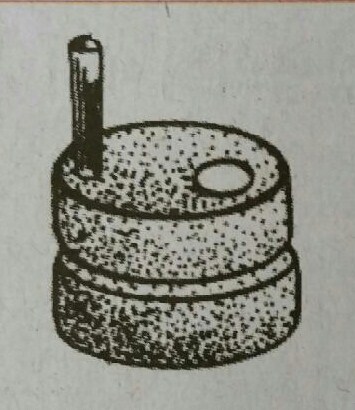
또 한 해가 저문다. 풍성하던 자연은 어느새 앙상함으로 자리한다. 유난히 폭우와 화재로 재난이 컸던 한 해였다. 이제 눈이 내리는 계절이 다가왔다. 너와집 처마 끝까지 눈이 내리면 그 속에 굴을 파고 세상천지 모르고 놀던 기억도 아련하다. 겨울의 추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해가 저무는 이쯤이면 대개는 뿌듯함보다는 아쉬움이 앞선다. 아무리 잘 살아도 지나고 보면 뭔가 부족함이 남는 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늘같이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고즈넉한 풍경은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흥법사는 유난히 정원수가 많다. 그래서 산사의 느낌이 아닌 공원 같은 느낌이다. 도량 전체를 장엄하고 있는 고급 소나무나 향나무 등 잘 다듬어진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 속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복에 환경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도 희비와 성쇠의 흐름이 있다. 어느 해는 단풍나무가 힘겨운 병색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느 해는 모과나무가 시름시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파하는가 하며, 때로는 강하다는 소나무도 누렇게 말라가서 긴장하게도 한다.
같은 공간 안에서도 형편에 따라 건강한 푸름으로 기쁨을 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당장이라도 뽑아내고 싶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나무가 더러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나무들의 상태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바뀐다는 것이다. 설령 지금은 뽑아내야 화단이 더 어울릴 것 같던 그 나무도 인내의 세월 속에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건강하게 변화하는 것을 보면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보기에 부족하다 하여 뽑아내기 시작한다면 오래지않아 화단은 빈 뜰이 될 것이다. 그저 묵묵히 여유 있게 바라봐 주면 화단은 알아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한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느 해는 절망의 나락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어느 해는 세상을 얻는 기쁨으로 환희 용약하기도 한다. 어느 시기는 내 삶에서 영원히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시기는 평생을 두고 자랑거리로 삼으며 뿌듯해하기도 한다. 물론 삶의 시간들은 뜰 앞의 나무처럼 뽑고, 또 심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모든 것이 내 삶의 소중한 흔적일 뿐이다. 그래서 좌절의 세월을 맞는다고 그 못난 것에 빠져 스스로를 내 팽겨 쳐서도 안 돤고, 형편이 잘 풀려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자만할 일도 아니다. 과거는 그저 추억 속에 존재하고 미래는 다만 우리의 기대 속에 존재한다.
올 한해도 삶의 무게를 따라 쓰디쓴 아픔의 추억에서부터 감동의 드라마까지 각각의 인생을 따라 천백억의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대게는 시대상의 반영이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다분히 전투적이다. 정신없이 바쁘다. 이웃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 마치 치열한 생존경쟁을 치르는 전쟁터다. 오늘처럼 오는 비에 마음 적시면 돌아본 지난 일년의 삶도 크게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진정 이렇게 살다가 가는 존재인 것인가. 잘 가꾸어진 앞뜰에도 우리들의 인생에도 언제나 인연의 소치로 그려지는 희비와 성쇠의 쌍곡선이 있게 마련이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이 소중한 흔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차 한 잔의 여유도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